● 전 시 명 : 당림미술관 중견작가 초대전 [무위, 새벽을 깨우다]
● 전시기간 : 2019.8.23(금)~10.24(목)
● 전시장소 : 당림미술관 전시관
● 작가소개 : 이제훈
● 오픈시간 :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무
● 관람요금 : 성인 4000원 학생 2000원
● 주소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1182번길 34-19 당림미술관
● 문의 : 041-543-6969
● 웹사이트 : http://dangnim.modoo.at/
● 전시안내
이제훈, 새벽의 풍경화
홍지석(단국대학교 힌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이제훈의 <무위, 새벽을 깨우다>(2015)는 양산 통도사(通道寺) 입구에 있는 소나무 길을 그린 풍경화다. 통도사 주변에는 ‘무풍한송(舞風寒松)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둘레길이 있는데 그 둘레길 소나무가 꽤 근사한 모양이다. 이제훈은 2012년에 통도사를 방문했다가 그 소나무 길에 반하여 꽤 오랫동안 양산에 거처를 두고 그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2012년 부산 갤러리나무에서 열린 열 번째 개인전부터 “통도사 소나무가 있는 둘레길”은 이제훈의 풍경화를 대표하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됐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은 꽤 오래전부터 이제훈 풍경화의 화두였다. 이를테면 2010년 부남미술관 개인전의 중심 주제는 ‘무위자연’이었다. 2015년 개인전 <새벽을 깨우다>展(은암미술관) 도록에서 그는 ‘무위자연’을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으로 설명했다. 이렇듯 인간의 힘으로 쉽사리 파악하거나 장악할 수 없는 대자연의 섭리를 풍경화의 형태로 가시화하는 것이야말로 이 화가의 중요한 과제였다. 그런데 무위자연, 곧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이란 어떻게 화가의 그리는 행위를 통해 가시화될 수 있을까?
자연을 대하는 마음의 거리나 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제훈은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 1930~2012)의 관점을 예시한다. 암스트롱이 1969년 달에서 바라본 지구는 어떤 것이었을까? 거기서는 거대한 대지, 지구가 콩알 크기의 녹색 점으로 보일 것이다. 이 우주적 거리와 관점은 세속의 온갖 욕망과 갈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 이 우주인은 그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이 한없이 작고, 또 작게 느껴졌다”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관조하는 우주적 경험을 상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는 경험을 환기할 수도 있다. 홀로 피어있는 들꽃을 쭈그리고 앉아 지켜보았던 장일순(張壹淳 1928~1994) 선생의 태도를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알의 좁쌀이 영글기까지 대지와 바람, 비와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기에 결국 좁쌀 하나에 우주와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는 장일순 선생의 통찰을 긍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화가의 생각이다. 마침 그 장일순 선생의 호가 바로 ‘무위당無爲堂’이다.
닐 암스트롱과 장일순 선생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자연 앞에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그로부터 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이제훈은 말한다. “자연을 말없는 선생님으로 섬기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강화 볼음도에는 800살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고목은 그 자리에서 800년간 일어난 온갖 사건과 사연들을 지켜본 어르신 나무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제훈이 다석(多夕) 유영모(柳永模 1890∼1981)와 함석헌([咸錫憲 1901∼1989) 선생을 따라 ‘씨알사상’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 그대가 곧 우주이자 씨알이라는 씨알사상의 가르침을 새겨듣고, 실천적 태도를 강조한 함석헌 선생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 부(富)는 증대됐으나 우리의 삶은 왜 좀 더 행복해지지 못했을까?”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라는 물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남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을 사랑하십시오”하고 했던 함석헌 선생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렇게 자연에서 세상의 이치를 구하고 자연으로부터 윤리적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화가가 그린 풍경화는 어떤 형식을 갖게 될까? 그는 자신의 풍경화가 눈으로 본대로 그린 풍경화, 사진처럼 단지 눈앞의 현실을 기계적으로 기록한 풍경화가 될 것을 염려한다. 그에게 리얼리즘이란 눈으로 보는 대상의 외형적 리얼리티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자연의 본질, 즉 내면적 리얼리티에 육박하는 회화를 뜻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자연의 본질과 내면적 리얼리티에 육박하고자 하는 풍경화는 그저 눈으로 본대로 그린 풍경화에 비해 훨씬 더 명상적이고 정신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회화가 명상적, 정신적 성격에만 치우쳐 관념의 회화가 될 것을 이 화가는 또한 우려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원하는 풍경화란 정신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풍경화,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회화에 가깝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제훈이 “관계속의 리얼리즘”을 강조하는 이유일 것이다.
<무위, 새벽을 깨우다>(2015)로 다시 돌아오면 이 풍경화는 이미 제목에 명시된 대로 “새벽” 통도사 소나무 길을 그린 것이다. 새벽 동틀 무렵 소나무 길을 묘사한 가로 240cm, 세로 120cm 크기의 이 큼지막한 풍경화는 새벽 숲의 정갈하고 습윤한 분위기를 잘 나타냈다. 이제훈은 이 새벽길의 독특한 분위기를 매우 아낀다. 그가 시조시인 고춘식이 제시한 “무위(無爲), 새벽을 깨우다”라는 명제를 자기 회화의 주제로 삼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새벽 오래된 사찰의 둘레 길에는 기도를 위해 사찰을 찾는 이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잠든 대지를 깨우는 새벽 그윽한 소나무 길에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올곧게 가다듬는 일이 가능하다. 마치 신선이나 된 듯 다른 세상에 있다는 느낌을 이 화가는 만끽한다. 풍경화가로서 이제훈은 빛이 만개한 햇빛 쨍쨍한 대낮보다는 안개 낀 풍경, 비오는 날의 풍경을 더 좋아한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싱그러운 공기가 좋다는 것이다. 그런 날일수록 식물의 줄기는 더 까맣게 짙게 보이고 풀의 윤기는 유난히 두드러져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하루 중 이런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대가 바로 새벽이다.
새벽은 또한 ‘비결정’의 시간이다. 그것은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시간이다. 또는 밤이면서 동시에 낮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애매하고 모호한 것, 즉 ‘결정’ 이전의 ‘비결정’ 상태, 현실태가 아닌 잠재태를 옹호했던 작가들이 새벽을 사랑했다. ‘어스름 새벽’을 노래한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새벽은 밤도 아니고 낮고 아닌 까닭에 밤의 어둠도, 낮의 태양도 결정적인 우세를 점하지 못한다. 따라서 새벽에는 빨강, 파랑, 노랑, 녹색 등 색채들보다도 차갑고 습윤한 대기가 훨씬 더 부각되기 마련이다. 색이 점점 빠져서 마침내 무채색처럼 보이는 이제훈의 <무위, 새벽을 깨우다>의 담박한 느낌은 이런 분위기를 부각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이렇게 색(色)이 약화됐다고 해서 이제훈 풍경화의 리얼리티가 약화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차갑고 습윤한 새벽에는 눈앞의 사물이 훨씬 더 선명하고 명료하게 보인다. <무위, 새벽을 깨우다>에서 소나무 표면의 물성 내지 질감 같은 것들이 유난히 돋보이는 현상은 이런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연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면 만날 수 있는 대상(소나무)의 촉각적 질(質)을 자기 풍경화에 아우르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훈의 새벽 풍경은 회화 특유의 시각적 질에 더하여 촉각적 질을 아우른 회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을 이제훈式 공감각(synesthesia)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게다. <무위, 새벽을 깨우다>에서 보듯 가장 애매한 시간인 새벽에 오히려 사물의 표면을 가장 선명하게 명료하게 대면할 수 있다는 발견은 새삼 경이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제훈의 경우 새벽 특유의 선명한 분위기, 새벽에 고유한 사물들의 명료한 질감을 선호하는 취미는 선명한 계절을 선호하는 취미와 연결되는 것을 보인다. 그는 “봄은 봄 같고 가을은 가을 같고 여름은 여름 같은 날”을 좋아한다. 이는 그가 계절이 선명한 전라남도 강진에서 나고 자란 인연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1960년생인 이제훈은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 고등학생 시절까지 강진에서 자란 것을 “화가의 복”이라고 말한다. 이제훈 풍경화에 두드러진 자연에 대한 감정이입(Empathy) 은 그의 고향 강진의 맑고 선명한 계절, 담박한 정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감정이입이란 “인간의 느낌이나 감정, 태도를 자연과 사물에 투사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시인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1770~1850)는 “달은 하늘이 밝았을 때 그 주위를 기쁘게 본다The moon doth with delight Look round her when the heavens are bare”고 노래했는데 이렇게 달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입적 태도다. 독일 미술사가 보링어(Wilhelm Worringer 1881~1965)는 감정이입이 “생명의 유기적 진실, 즉 한층 높은 의미로서의 자연주의에 기우는 태도”와 연관된다고 주장했다.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예술가는 유기적으로 아름다운 생명성을 구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이 화가를 두고 “구상미술계의 중진”으로 표현한 대로 이제훈이 자연 대상의 유기적 형태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표현해야 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입을 자신의 예술의욕으로 삼는 다른 많은 예술가들과 달리 이제훈은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연에 정착, 은둔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제나 이동 중인 보헤미안의 태도를 드러낸다. 실제로 그의 많은 풍경화들은 유기적 생명체의 균형과 조화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특유의 운동감을 드러낸다. 다시 <무위, 새벽을 깨우다>(2015)를 보면 풍경의 독특한 구도로 인해 화가(또는 관람자)는 길 한복판에 서있는 형국이다. 그의 자리는 정착한 자의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차라리 이동 중인 상태, 곧 다시 이동해야 하는 잠정적인 자리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나면 처음에 휴식과 명상의 공간으로 보였던 이제훈의 풍경화는 달리 보일 수 있다. 이를 두고 르네상스 회화에 대한 하우저(Arnold Hauser)의 유명한 평가를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우저에 따르면 르네상스 회화의 조화, 균형, 안정감은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안정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이상이자 허구에 해당한다. 르네상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본질적으로 동적인 시대, 어떠한 해결책에도 온전히 만족하지 못한 시대였고 그럴수록 르네상스인들은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안타깝게 허구적 조화와 안정의 공식에 매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염두에 두면 이제훈의 고요하고 담박한 풍경화는 이미 그에게 주어진 안락한 세계의 반영이라기보다 (화가가)염원하는, 또는 추구하는 이상(理想) 세계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이상세계는 지금 “진행 중” 또는 “건설 중”인 상태에 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까닭에 <무위, 새벽을 깨우다>를 지켜보는 경험은 매우 흥미진진하다. 그것은 매우 정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동적이다. 조용하면서도 매우 떠들썩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그 배경에 해당하는 새벽의 중충적, 또는 미결정의 상태를 닮았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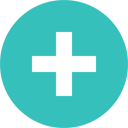 아카이브
아카이브 
